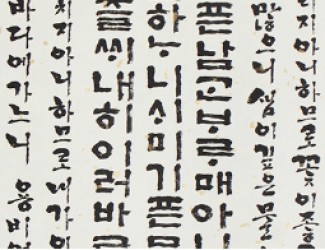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않는 한국 공포영화는 여름을 지나치지 않는다. <여고괴담>과 <장화, 홍련>의 성공으로 대표되는 공포영화 신드롬 이후 많은 공포영화들이 해마다 여름을 노리고 찾아왔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온> <링> 등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돼 큰 성공을 거둔 일본 공포영화들의 신화에 힘입어, ‘동양적 정서’라는 점에서 일본과 가까운 한국 공포영화의 해외 시장에서 운신의 폭도 넓어진 편이다. 서구에는 없는 귀신, 한풀이 정서가 동양 공포의 무기가 됐다. 이미 <폰>과 <인형사> 등은 내수 시장에서의 흥행과는 무관하게 할리우드 시장에 리메이크 판권이 팔린 상태다. 공수창 총감독의 지휘 하에 OCN에서는 TV용 공포영화를 제작하는 등 최근 한국 공포영화는 장르로서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분명 좋은 현상이다. 그럼에도 한국 공포영화는 매년 ‘절반의 실패, 절반의 성공’이라는 미지근한 평가 속에 다음 해를 기약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영화 장르의 지형에서 ‘공포’는 분명 재고되어야 할 화두다. |
한국 공포영화, 시장에 안착하다 ‘하위 장르’라는 곱지 않은 시선 속에 전통과 단절해야 했던 한국 공포영화의 부활을 알린 영화를 추적하자면, 저 멀리 <구미호>(1994)까지 거슬러갈 수도 있겠으나 공포영화 관객과의 교감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몇 년 뒤로 이동해야 한다. 1998년 한 달여 시간차로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코믹 잔혹극 <조용한 가족>과 박기형 감독의 <여고괴담>이 그것이다. 두 영화는 80년대 이후 완전히 단절됐던 한국 공포의 부활을 알린 기념비적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수월하지는 않았다. <조용한 가족>은 당시 ‘새로운 기획’을 케치프레이즈로 내 걸었던 명필름의 도전을 통해 이뤄진 성과였고, <여고괴담> 역시 공포영화에 남다른 집념을 보여온 오기민 프로듀서(현 마술피리 대표)의 예지적 선택에 힘입은 바 컸다. “지금 이 시점에 웬 공포영화냐, 미친 것 아냐 라는 시선을 감수해야만 했다. 당시에는 공포영화도 없었지만 ‘여고’를 무대로 하는 하이틴영화도 전무한 시절이었다. 그래서 <여고괴담>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오기민 프로듀서의 말이다. 하지만 두 영화 모두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고 공포 장르뿐 아니라 한국 상업 영화의 폭을 한 뼘 넓혀주었다. 1999년에는 김태용, 민규동 감독의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전작에 버금가는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비평의 찬사를 받으며 ‘공포=싸구려 B영화’라는 도식을 무너뜨렸다. 같은 해 <식스 센스>와 <스크림> <링> 등 지금까지 한국 공포영화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외화들이 줄줄이 개봉했다. 뒤늦게 개봉한 <스크림>(1996)과 더불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1998) 유의 케빈 윌리엄슨 각본 영화들은 이듬해 <해변으로 가다> <찍히면 죽는다> 등 한국형 슬래셔 무비라는 변종 장르를 잉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식스 센스>는 질긴 반전 콤플렉스의 모태로 지목되고 있으며, <링>은 동양적 원귀 혹은 길고 검은 머리로 대변되는 ‘사다코’의 망령을 한국 공포의 아이콘으로 이식하는 근거가 됐다. 안병기 감독의 <가위>를 제외하고 2000년 한국형 슬래셔 무비들이 참담한 실패를 맛본 이후, 윤종찬 감독의 <소름>(2001)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국 상업 영화 시장에서 공포영화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다시 그 부활을 견인한 것은 어느덧 ‘공포영화 전문’ 감독이라 불리게 된 안병기 감독의 <폰>(2002)이었다. 정확히 2002년 여름 시장을 겨냥했던 <폰>은 한국 공포영화 중 최초로 2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흥행 성공을 거두었고 할리우드 매버릭영화사에 리메이크 판권이 팔리고, 이탈리아에서 개봉해 박스오피스에서 선전하는 등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다시 공포영화로 끌어왔다. 2003년에는 다시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이 300만 명이 넘는 대박을 터뜨렸고 윤재연 감독의 <여우 계단>, 이수연 감독의 <4인용 식탁>, 김성호 감독의 <거울속으로>, 박기형 감독의 <아카시아> 등 흥행을 떠나 감독들의 개성만큼은 뚜렷한 작품들의 행보를 지켜볼 수 있었다. 2004년은 김태경 감독의 <령>, 안병기 감독의 <분신사바>, 정용기 감독의 <인형사>, 유상곤 감독의 <페이스>, 신정원 감독의 <시실리 2km>, 공수창 감독의 <알포인트> 등 다양해진 소재만큼 ‘여름 시즌용’이라는 한국 공포영화 시장의 뚜렷한 소비 유통 체계가 자리 잡은 시기라 할 수 있다. 김용균 감독의 <분홍신>, 최익환 감독의 <여고괴담 4-목소리>(이하 <목소리>), 원신연 감독의 <가발>, 이우철 감독의 <첼로> 등 네 편이 개봉한 2005년은 개봉 시기와 제작 편수 등에서 외형은 지난해와 흡사하다. 하지만 흥행과 비평에서는 그리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가발>과 <첼로>가 개봉 중이지만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전국 140만 명 관객을 동원한 <분홍신>이 최고 흥행 공포 영화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충격은 <여고괴담> 시리즈 최신판인 <목소리>가 야심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패퇴한 것. “감독들의 생각은 많아졌는데 관객과의 소통을 이루려는 고민은 줄었다”는 평가가 들리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최근 몇 년간 한국 공포영화의 투자, 제작, 배급 시스템이 일정한 순환의 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사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변한 건 확실하다. 적어도 서너 편 이상의 공포영화들이 매년 여름 시즌을 겨냥해 제작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내다보고 있다. <여고괴담>과 <장화, 홍련>이라는 당대 한국 공포를 대표하는 두 영화를 프로듀싱했던 오기민 프로듀서는 “<여고괴담>을 만들려고 할 때는 다들 미친놈 취급했는데, 5년 뒤 <장화,홍련>을 기획할 때는 김지운 감독의 이름값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만으로도 펀딩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공포영화를 대하는 태도나 제작 환경 자체가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말한다. <목소리>의 전려경 PD 역시 “<여고괴담> 시리즈도 2년 정도를 주기로 계속 속편이 만들어질 것 같다”고 말한다. 변화된 상황을 증거하는 징후들은 더 있다. <4인용 식탁>의 전지현, <령>의 김하늘, <분홍신>의 김혜수에서 볼 수 있듯이 ‘스타 캐스팅 불가’라는 과거의 불문율도 조금씩 깨지고 있다. 김지운 감독의 <장화,홍련>은 이른바 ‘벽지 호러’라는 신조어를 남길 정도로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며 웰메이드 공포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