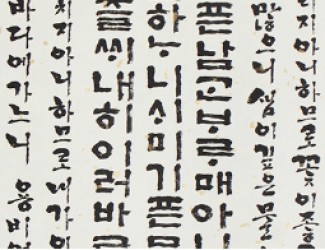제60차 유엔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의 유엔총회장에 19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였다. 이들의 역할은 이틀 뒤인 14일부터 열리는 정상회담 선언문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난산(難産) 끝에 나온 결과물은 용두사미(龍頭蛇尾)였다. 선진국은 선진국끼리, 혹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테러방지와 후진국 빈곤퇴치, 인권보호 등 3대 쟁점에서 실천 가능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 외교관은 “이것이 유엔의 한계이자 진면목”이라고 평가했다. 유엔의 위상이 이렇게 추락한 배경은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로 탄생한 유엔은 탈냉전 이후 국제분쟁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듯했다. 가령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당시,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다국적군 파견을 결정했고, 2001년 9·11테러 직후에는 테러지원국가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승인했다.
그러나 2003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계기로 유엔은 결정적인 분열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무력사용을 주장한 반면, 독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은 이에 적극 반대했다. 이 같은 대립의 배경에는 이라크 석유자원 확보와 중동지역 세력확장문제가 숨어 있다는 게 정설이다. 유엔 사무국 관계자는 “이라크전의 명목은 테러응징이었지만 실상은 석유다툼이었고, 이 싸움은 유엔을 결정적으로 분열시켰다”고 평가했다.
회원국 분열 못지않게 유엔의 권위를 손상시킨 요소는 사무국의 비효율성과 부패스캔들이다. 유엔의 이라크 ‘식량을 위한 석유수출(oil-for-food)’ 프로그램을 조사한 폴 볼커 위원회는 이라크 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뇌물과 리베이트로 18억달러를 챙기고, 유엔 집행관들이 수십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PKO)은 레바논·콩고 등 주둔지에서 금전비리와 성추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모든 경비를 유엔에서 지원받는 평화유지군이 콩고에 1만9000명이나 투입됐지만 치안유지와 사회안정에는 실패했다”며 PKO의 근본적인 효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위기에 몰린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03년 유엔 개혁에 착수했다. 안보리 체제를 바꾸고, 후진국 지원과 인권보호 등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그의 개혁안은 한계에 부딪혔고, 그 실상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안보리 확대 방안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독일·일본·인도·브라질에 맞서, 미국·중국·한국·이탈리아·캐나다 등이 거부감을 보이면서 유보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유엔의 회원국 수가 191개나 되고 이해관계도 워낙 복잡해 유엔 개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개혁 없이는 유엔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유엔정책을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폴리시’는 “유엔 헌장 개정이 필요한 안보리 개편보다는 안보리회의를 보다 개방하고, 안보리 안건을 하위 기구에 더 많이 위임해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