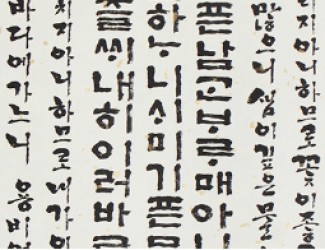<한국의 불행은 재미동포에게는 행복? 한국의 경제부진 등 평상시 상황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불안정과 불평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대거 이민 행렬에 참가한다면 한국의 불행은 곧 재미동포의 행복이 된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경제, 즉 돈이다. 그래서 한인들에게 남는 문제는 항상 돈이다. 조그만 가게 하나만 있고 돈만 착실히 들어온다면 ‘사장님’ ‘회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게 미국 땅이다. 재미동포들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런데 그 돈을 싸들고 한국인들이 이민행렬에 몸을 던진다니 선참 이민자인 한인들에게는 바로 ‘횡재’가 된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선참 이민자가 후참 이민자를 이용 또는 착취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신분적으로 열등한 위치인 신참 이민자들은 이미 자리잡고 사는 선배 이민자들에게 돈과 노동력을 갖다 바치는 과정을 겪고서야 비로소 미국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후참자 착취’가 극대화되는 것은 ‘미국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여 사는 민족들’에서다. 그리고 미국의 한인사회는 ‘끼리끼리 모여 사는’ 대표적 민족집단이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민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타운’을 형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미국에 많은 타운은 차이나 타운, 코리아 타운, 베트남 타운 등이다. 이 중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월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우선 영어를 잘할 뿐 아니라 이민 역사도 길어 완전히 미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다. 이미 이민 3·4·5세가 활동하며 연방 노동부 장관까지 배출해 냈다. 일본인 역시 수는 적어도 특유의 근면·성실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으며, 착실히 뿌리를 내리기는 중국인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역시 일본계 장관을 배출해냈다.
인도·파키스탄계 역시 이민자가 많지만 그들은 우선 영어를 잘한다. 또한 그들은 한인과 달리 동업 또는 협업을 잘하기 때문에 한인들은 넘볼 수 없는 경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인도·파키스탄인들은 협업을 통해 미국의 주유소 시장과 모텔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으며, 구멍가게에 만족하는 한인들과는 규모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남는 것이, 끼리끼리 뭉쳐 사는 대표적 이민자 집단인 한인과 베트남계가 된다. 그런데 베트남계는 한인들과는 또 다르다. 한인들이 ‘많은 돈’에 집착하며 사는 한편 베트남인들은 소박한 편이다. 대개의 한인들은 아침밥을 먹고 출근해 한국사람끼리 모여 한국말로 업무를 보다 퇴근해 한국 TV를 보며 저녁을 먹고 한국 비디오 한 편 보고 잠드는 일상으로 산다. 한인들 중에는 미국인을 상대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한인을 상대로 돈을 번다.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인이 한인을 우려먹는 구조 역시 잘 발달돼 있다.
한인 사회의 특징이 이렇다보니 신참 이민자들은 각오를 잘 하고 와야 한다. 미국이든 캐나다든 이민 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다음 각오들 중 하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착취를 당해도 할 수 없지만 나에 대한 착취가 끝나면 나도 후참자를 착취할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국행을 결행하든지, 아니면 나는 착취를 당하기 싫으니까 미국 사정을 철저히 사전조사하고 한인 사회가 아닌 미국 사회로 바로 진출해 미국 사람들 하고 함께 사는 방안을 마련하고 오라는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결국 미국 사회에서 ‘인생의 쓴맛’만 보고 쫓겨나가거나 낙오자가 된다.
모국이든 조국 또는 본국(미국에 사는 한인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한인들이 쓰지 말자고 하는 말 중 하나)이든 최근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이민자들의 심정은 ‘춘향이 널 뛰듯’ 기복이 심하다. 군부 정치든 IMF 사태든 한국이 싫어서 아니면 못견뎌 미국으로 온 사람들은 한국이 못산다고 하면 “그래, 역시 나는 잘 왔어”라며 안도감을 느낀다. 반면 한국이 잘 산다고 하면 “왜 나는 여길 와 이 고생을 하는 걸까”라며 한숨을 쉰다.
한국 사회의 기복이야 어떻든 요즘 미국에서 예컨대 ‘이민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바쁘신 몸들이다. 이민 역사상 최고의 호기가 왔다며 서둘러 한국에 지사를 차리고 모객 활동을 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속속 몸을 싣고 있다. 이민 사회가 한몫 단단히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8년 미국에 온 필자는 그간 줄곧 “그 사람 한국에 직장 얻어서 간다더라, 참 잘됐네”라든지 “미국엔 뭣하러 와. 고생하러 오나”란 소리를 동료 한인들로부터 들어왔고 스스로도 해왔다. 미국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본국을 못 잊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사람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 분위기는 참으로 송구스러운 현실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 사는 우리’를 천대하는 발언들은 올 하반기 한국에 이민열풍이 불면서 싹 사라졌다. 이제 한인들끼리 하는 말은 대개 “한국에 뭣하러 가? 다 이리로 온다는데” 아니면 “먼저 온 내가 잘했지”로 바뀌었다.
이런 말들은 다 한국과 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이며 ‘뿌리 내리고 살지 못함’의 증거들이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인들도 해외동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한반도가 과연 내가 살 땅인가”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역시 자기가 사는 땅에 마음을 붙이고 살지 못하는 현상이다. 바야흐로 한민족 전체의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